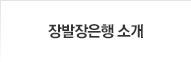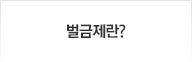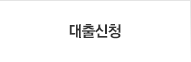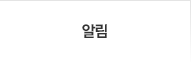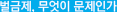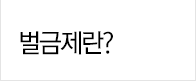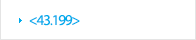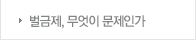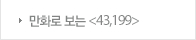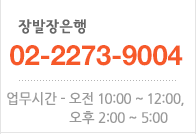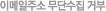|
|
|
<43,199>
벌금형(罰金刑)은 여러 가지 형벌 중의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이라고 생각하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구금시설에 가두는 징역, 금고 등의 자유형(自由刑)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자유형(自由刑)은 기본적으로 너무 가혹한 처벌입니다.가정이 파괴되거나 사회생활이 단절되고, 교도소에서의 범죄 오염 등의 폐해와 적지 않은 수감 비용 때문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벌금형 등의 재산형(財産刑)은 그래서 자유형의 대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니 범죄의 대가로 돈을 빼앗는다면, 그 자체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한 단기 자유형을 선고할만한 경미한 범죄나 과실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오늘날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선고가 전체 형사처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형(刑)의 종류를 바꿔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를 환형유치(換刑留置)라고 합니다. 돈을 내지 못하면, 몸으로라도 때우게 한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질러서 벌금을 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그 벌금마저 내지 않는다면(못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이 매년 4만명이 넘습니다. '43,199'는 2009년 한 해 동안 벌금 미납(未納)을 이유로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벌금형은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지만, 벌금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교도소에 가야 합니다. 교도소에 보내지 않기 위해 마련한 제도였지만, 결국 매년 4만명 이나 되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죄질이 나쁘거나, 재범(再犯)의 우려가 높거나,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특별한 격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돈이 없어서,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겁니다. 이는 경제적 형편에 따른 차별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갇혀야 하는 사람이 매년 4만 명이라는 건, 한국사회가 여전히 가혹한 비인간적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건 확실히 제도가 잘못된 탓입니다. 우리나라 벌금제는 죄질에 따라 누구나 똑같은 벌금을 내게 합니다. 얼핏 보면 공평할지 모르지만,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의 차이가 엄청난 상황에서는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100만원의 벌금이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혹한 처벌이지만, 재벌처럼 돈 많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통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벌금 방식을 총액벌금제(總額罰金刑制)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 특히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득에 따라 다른 벌금을 냅니다. 독일은 형법에 소득에 따라 1유로에서 5천 유로까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벌금을 정합니다. 각자 소득에 따라 벌금 액수를 정한 다음에 5일(日)의 일수(一數)를 죄질에 따라 선고하는 겁니다.이런 제도를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라고 합니다. 법무부와 검찰 등은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기에 일수벌금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소득에 따라 다른 액수를 내고 있으니, 그만큼이라도 합리적으로 구분한다면, 지금처럼 가난한 사람이 노골적으로 차별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벌금을 선고받으면,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완납(完納)해야 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갑자기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눠 낼 수 있다면, 또는 다만 몇 달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면,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매년 100만 명쯤 되는 시민들이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범죄율이 낮고,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한국적 상황을 생각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별로 바꿔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로 바꿔야 합니다. 피해자도 없는 아주 가벼운 범죄는 아예 처벌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규정처럼 “법률로 정한 아주 특별히 해로운 행위”만을 범죄로 정해두어야 합니다.
어떤 가수는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라고 노래합니다. 맞습니다. 몸의 중심은 뇌나 심장이 맞겠지만, 손톱 밑의 가시나 목에 가시처럼 작은 고통에도 우리는 온 몸의 신경을 집중시킵니다. 그게 온 몸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손끝이나 발끝도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내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아픈 곳을 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도 하나의 유기체로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있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아픈 곳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단지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아픈 존재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많은 사회적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교도소에 가야 하는 야만적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된 벌금제는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공화국의 기본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법질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법이 제대로 지킬만한 것인지를 살피고, 보완활 점은 없는지를 끊임없이 찾으면서, 법이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게 국가의 역할이어야만 합니다.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시민들이 나서서 지적해주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